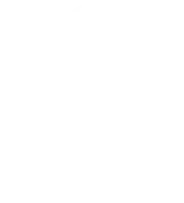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Date | 17/11/03 14:22:33 |
| Name | 소라게 |
| Subject | 아주 작은 할아버지 |
|
우리 할아버지는 웃기는 할아버지였다. 하여튼 우리 집안 어른들에게는 특이한 구석이 하나쯤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유별나게 급한 성격이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빨라진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그랬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의 일이다. 할아버지는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술잔에 술을 쉼없이 따랐다. 한잔, 두잔, 세잔, 그리고 마실만큼 마시면 딱 내려놓고는 자리에 마신만큼의 술값을 두는 거다. 친구들이 두 눈이 휘둥그래지면, “마실 거 다 마셨으니까 간다.” 하고는 뒤도 보지 않고 사라졌다. 술 마시러 왔으니까 술 다 마시면 가는 거다. 과연 우리 할아버지다웠다. 또 있다. 할아버지 생신날이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불을 끄고는 다들 노래를 시작했다. “생신 축하합니다.” 막 두 번째 소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불을 훅 꺼버렸다. 옆에 있던 이모가 기가 막혀서 물었다. “아부지, 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끄면 어떡해요?” 들을 거 다 들었으니 시간낭비 안하고 꺼도 된다는 게 우리 할아버지의 지론이었다. 뭐 더 항의해봤자 귓등으로 들을 할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도 본론만 깔끔하게 하고 끝내는 걸로 타협을 봤다. 아니지, 타협이라기엔 너무 일방적이었으니 우리가 할아버지 기세에 밀린 거다. 할아버지는 장난을 치는 것도 아주 좋아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메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메일 주소가 루시퍼 어쩌고였다. 순전히 기독교인이던 우리 할머니를 놀리려고 만든 거다. 할아버지는 메일을 만들자마자 할머니한테 메일을 썼는데, 할머니는 “흥!” 하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성경은 엄청 열심히 읽었는데, 할아버지 맘대로 구절을 마구 인용하면 우리 할머니는 또 “흥!” 했다. 할머니가 교회를 갈 때면 언제나 할아버지가 차키를 들고 따라나섰다. 교회 밖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권사님 모셔다 드려야지 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던 사람은 할머니만이 아니었다. 그 옛날에도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모두 학교에 데려다주곤 했다. 엄마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다고 한다. 엄마는 본인이, 아버지 꼬랑지라고 했다. 엄마는 할아버지만 보면 팔짱을 꼈다. 그러면서 온종일 장난을 쳤다. “내가 아부지 닮아서 성격이 나쁜가 봐.” 하면, “우리 따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걸었다. 나도, 할아버지의 차를 탔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 눈에 손주들은 어디까지나 꼬맹이들이었다. 그게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동요 테이프를 틀었다. 나만이 아니었다. 사촌오빠도, 사촌동생도. 우리는 할아버지 차에서 다 같이 동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갔다. 할아버지는 ‘꼬맹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오면, 꼭 과자를 한아름 안겨 주었다. 할아버지는 단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니 우리 꼬맹이들에게도 좋아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거다. 할아버지는 동그란 수입 쿠키 상자에, 그때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외국 과자들을 이것저것 모아서 넣어 주고는 했다. 한번은 할아버지 옆에 서 있다가 ‘맛있는 거’라고 은색 포장지에 싸인 과자를 받았던 기억도 난다. 할아버지와 나는 나란히 서서 은밀한 행동이라도 하듯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씨레이션이었던 것 같다. 자식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손주들 이빨이 남아나지 않는다며 투덜투덜 난리였지만 할아버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할아버지였지만 자식들이 뭘 주려고 하면 한사코 받지 않았다. 차로 데려다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는 고집이 무지무지 셌는데, 불행하게도 아빠를 쏙 빼닮은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오면서 그 먼 거리를 꼭 버스를 타고 왔다. 하루는 엄마가, 그 옛날에도 내내 데려다줬는데 엄마는 못 데려다 줄 게 뭐냐고 따졌다. 할아버지는 두 다리 멀쩡하니 괜찮다면서 계속 우겼다. 엄마도 차를 타면 서울 어디든 오 분이면 다 간다고, 게다가 할아버지를 모셔다 주는 그 곳에 시장이 있으니 거길 꼭 가야만 한다고 맞섰다. 두 고집쟁이들의 대결은 볼만했지만, 결국은 엄마 고집대로 모셔다 드렸다.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모셔다 드리려면 아주 힘들었지만 말이다. 할아버지의 고집은 아픈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병원비를 할아버지가 내겠다는 거다. 자식들은 몰래몰래 병원비를 내고 모른 척했다. 공짜라고, 싸다고, 그냥 해 주는 거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할아버지도 알면서도 나중에는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거죽만 남은 것 같아. 꼭 허깨비 같아. 나는 병원에 가고 나서야 그 말을 알았다. 할아버지가 반으로 줄어 있었다. 그렇게 마른 할아버지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의사는 할아버지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유리병에 든 사탕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너희 다 먹어라. 응, 다 가져가라.“ 유리병 안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캬라멜과 사탕들이 그득 차 있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탕들이, 하나도 줄지 않고 꽉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돌아왔다. 그 뒤로 할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낫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딱 하루, 진통제를 조금 덜 넣기로 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니까. 직전까지 나는 할 말을 고민했지만, 결국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그토록 괴로워 하던 할아버지가, 정신이 채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손주들이 모이니 활짝 웃었다. 옛날부터 할아버지는 꼬맹이들을 좋아했다. 꼬맹이들이 보이면 손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쥐어주지 않고는 못 배겼다. 나는 단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는 야단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웃는 얼굴의 할아버지뿐이다. 며칠이 또 지났다. 이상하게도 이 글이 너무 쓰고 싶어졌다. 온종일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이유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집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눈을 감은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다. 할머니의 눈은 새빨갰지만, 우리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홀로 밤을 새우며, 할머니는 소리없이 울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지독한 시집살이를 했다. 고모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 어느날은 영양 크림을 하나 가져와서는 건넸다. 할머니는 그걸 한 손으로 탁 밀어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런 거 안 써요.” 그게 할머니의 자존심이었다. 장례식 날에도 할머니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님을 맞았다. 두 눈이 붉어질 지언정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누구에게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모지리 손녀가 옆에서 울면,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위로해야 할 건 난데, 힘이 되어야 하는 건 난데.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칠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지다니’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화장한 뒤, 유골함을 끌어안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는 몰랐다. 그런데 이제야 그 말뜻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반쪽이 되더니, 이제는 항아리 하나만큼 작아지고 말았다.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해. 저렇게 작아져서 어떻게 해. 저렇게 자그마해진 할아버지를 보니, 이제는 정말로 헤어져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할아버지 가지 말아요, 네? 할아버지, 어디 가지 말고 저랑 오래오래 살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떠나 보내기 싫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철없이 할아버지를 그저 붙들고 싶었다. 떠나 보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오는데도. 자그마해진 할아버지 앞에 섰다. 영정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유골함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11-13 08:26) * 관리사유 : 추천 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36
이 게시판에 등록된 소라게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