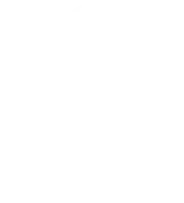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21/10/11 16:27:02 |
| Name | 머랭 |
| Subject | 약간의 일탈과 음주 이야기 |
|
모 소설에서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어렸을 때 나는 위로는 부족하고 아래로는 충분한 그런 아이였다. 그말인즉슨, 적당히 공부는 했지만 금지된 무언가를 굳이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지는 않았다는 소리다. 하지만 뭐 거창한 걸 하기엔 내 담이 그만큼 크지 않았으니, 이 이야기는 고작해야 미성년자 음주 이야기일 뿐이다. 내 첫 번째 공식적인 ‘금지된’ 음주는 열다섯살 때였다. 그렇지만, 이건 순전히 내 충동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은 전교조 출신의 열혈 남성 교사로, 대단히 열정적이었지만 사랑의 매를 놓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름방학이었던가. 선생님은 우리들을 불러, 이틀간 학교에서 캠핑을 하게 해 주었다. 공포 영화도 봤고, 뭐 늘 그렇듯이 카레도 해 먹고, 뻔하지만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무려 여름방학에 굳이 아이들을 불러모은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에 보답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당시 우리 반은 단합이 잘 되는 편이었다. 망 보는 애 서넛을 빼고는 선생님을 빼놓은 채 어느 교실에 모였다. 어떤 아이가 검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그건 소주였다. 그 방 안에서는 좀 논다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걸 접하지 못한 아이도 여럿이었다. 다같이 눈을 떼굴떼굴 굴리다 우리는 순서대로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한 1/3쯤 마셨을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다. 무척 화가 난 선생님이 거기에 있었고, 곧 있으면 내 순서가 올 참이었다. 즐거운 여름방학 캠프는 결국 모두 기합 비슷한 것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나는 무척 억울했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난 나서는 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때는 뭐랄까. 벌만 받고 내가 받아야할 상은 챙기지 못한 것 같았다. 술에 대한 열망이라거나 동경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지만, 그걸 마시지 못한다면 분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당시 친하던 친구 넷을 불렀다. 그 친구들도 나의 이 억울하고도 분한 마음에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돈을 모았고 놀이터에 모였다. 누군가가 가져온 휴대용 라디오에서 당시 유행하는 그룹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놀이터란 공간은 상징적이었다. 집 근처 ㅇㅇ공고의 누구오빠라든지 누구언니가 이런 데서 모인다고들 했다. 실은 전혀 아니었지만. 우린 아주 우등생도 아니고 특별한 불량학생도 아니었다. 그당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다. 흑이든 백이든 무슨 상관이람. 적어도 회색보다는 낫지. 심정적으로 한밤중(사실 여덟시쯤이었다)에 미끄럼틀 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검은 봉투를 열었다. 그때 우리 반 친구가 사온 건 소주였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그건 좀 겁이 나서 맥주를 샀다. 맥주 한 피처를 나눠서 꿀꺽꿀꺽 마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맛이 좋지는 않았다. 뭐 엄청 취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그렇다. 우리는 꽤 어중간했지만 그날 술을 마시지 못한 나머지 2/3의 반 친구들보다는 앞서나간 것이다. 애초에 묘한 경쟁의식으로 벌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술을 마실 일은 없었다. 하나는 알았다. 나는 술이 약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또 대규모로 일을 벌리기에는 뭔가 크게 충족되는 것도 없었다. 술을 다시는 안 마시겠다는 다짐같은 건 없었지만 뭐 또 마실 날이 오겠어 하고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적인 음주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영국에 있었으니 10학년 때라도 해도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 나는 어중간하게 괜찮은 쪽이었지만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간 영국에서는 거의 변두리라고 봐도 좋았다. 부모님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를 어학원이 아닌 공립학교에 보냈고, 나는 눈을 끔뻑거리며 반 년정도는 준 벙어리로 지냈다. 그래도 혼자 다니리라는 법은 없는지 친구가 두 명은 생겼다. 한 명은 이탈리아 혼혈 친구로, 어순과 문법이 전혀 맞지 않는 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줄 정도로 괜찮은 친구였다. 또 다른 한 명은 영국 국적의 홍콩 친구였는데, 그 학년에 아시안이 나와 그 애 단 둘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인종적 의리를 지켜준 게 아니었나 싶다. 영국 공립학교의 비행은 뭐랄까. 한국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와 술은 잘 나감의 상징이랄까 아니면 일진의 상징이랄까 뭐 그런 거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담배처럼 보이는 대마초를 피웠다. 냄새가 하도 지독해서 영국 놈들은 담배도 뭘 저런 걸 피우나 투덜거렸더니, 친구가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해 준 이야기였다. 첫 육개월은 거의 죽을둥살둥 했지만 나머지 육개월은 괜찮았다. 제법 친구와 농담도 하고 한 시간이면 못 돌아볼 곳이 없는 조그만 시내에도 구경을 다니다 보니, 이탈리아 친구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친구의 이름은 로라였다.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키가 170쯤 되는, 퍽 예쁜 친구였다. 한번은 학교 밴드부 남자애와 사귀었는데, 그 남자애가 나를 말도 못하는 아시안 어쩌고저쩌고라고 하자 그 남자를 뻥 차버렸다. 의리와 미모 둘 모두를 갖춘 훌륭한 친구였지만, 당시 내가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감사인사는 땡큐와 판타스틱 혹은 베리베리 땡큐 정도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전할 수는 없었다. 로라의 집은 전형적인 영국 주택이었다. 폭이 좁고 층이 많으며 손바닥 한뼘쯤 되는 앞뜰과 뒤뜰이 딸려있는 그런 집 말이다. 방이 좁아서 우리는 뒤뜰로 나갔고, 로라는 주방에서 라자냐를 만들어 내왔다. 감사인사를 좀 멋지게 하고 싶었던 나는 머릿속으로 이 단어 저 단어를 마구 조합해 보다가 결국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것으로 끝냈다. 로라는 싱글싱글 웃으며 엄마가 사둔 싸구려 와인을 땄다. 두 번째 음주는 첫 번째 음주만큼 일탈 행위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가는 길목에서 대마초를 뻑뻑 피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음주가 뭐 대단한 일탈행위라고. 우리는 계단에 앉아 잔도 없이 포도주를 돌려 마셨다. 싸구려 포도주는 무척 달았고 조금 이상한 맛이 나기도 했지만 기분이 확실히 괜찮아졌다. 술이 깨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앉아 오래도록 수다를 떨었다. 누구랑 누구가 사귄다는 얘기라든지, 몇 학년 누구누구는 양다리였다든지. 시덥잖은 얘기 끝에 로라가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갈거야? 응. 거기 가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다행히 약속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로라네 집에서 모였고 새빨개진 얼굴이 진정될 때까지 수다를 떨었다. 로라네 뒤뜰은 술 마시기 좋은 공간이었다. 선선한 공기, 아이들이 술 마시는 것 정도는 비행이라고도 여기지 않는 이웃들(이건 중요했다), 그리고 잔 없이 병으로 돌려마시는 것 특유의 분위기라고 해야하나. 영국에서 나는 종종 술을 마셨고 그러면 말을 좀 잘하게 되는 기분이 들었다. 어차피 집으로 가 봐야 시끄러운 부부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지금 나에게 고르라고 해도 로라네 뒤뜰을 고르지 이른 귀가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좀 더 어중간한 학생이 되었다. 영국 생활 일년이 더해진 덕분이었다. 난 순조롭게 원래 생활로 돌아갔고 음주를 하거나 영국제 신문물을 소개하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뒤로 십년동안, 살아가는 것이 정말 버거웠다는 기억밖에 안 든다. 어제 홀로 적당한 가격의 와인 한 잔을 따르면서 문득 그 때 생각이 났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을 때 술을 마셨는데 요새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기 싫을 때 술을 마시다니. 로라네 뒤뜰이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퇴보시킨다. 맛이니 향이니 숙성이니 뭐니 해도 결국 나에게 술은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니 술을 마실 때는 약간의 일탈이라도 곁들여야지. 막 나가는 건 이제 좀 힘든데, 뭐 좋은 거 없으려나.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