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16/03/01 17:19:13 |
| Name | 얼그레이 |
| Subject | [조각글 16주차] 만우절 |
|
[조각글 16주차 주제] 좋아하는 음식 / 일요일 / 친구 / 거짓말 / 목소리 위 다섯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여 소재로 삼아 글을 쓰시오. 합평 받고 싶은 부분 하고 싶은 말 전에 약속했던 '고래'와 관련된 글입니다. 누군가는 보셨을 수도 있을 글입니다. 본문 삼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다만 기억나는 것은. 그토록 길게 느껴지던 집까지의 거리. 그의 고개 숙인 한숨. 느린 발걸음. 그런 그의 모습이 나는 보기 싫었던 걸까, 화두를 던져보았다. '오늘은 별이 안 보이네요. ' '원래 서울에서는 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요…말을 하다 멈추었다. 고래의 한숨 소리. 그날따라 밤하늘은 왜 그리 어려워 보이던가. 어두운 밤하늘이 서서히 침강한다. 길가에는 우리 둘의 발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밤하늘이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우리 둘 사이에는 하지 못한 말들이 실타래처럼 엉키고 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빨리 걸으나, 변함없는 그의 발걸음에 다시 걸음을 늦췄다. 밤길을 걸으며 고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이 목덜미에 스친다. '안 추워요?' 고래는 내 마음을 읽는 듯 재차 묻는다. '괜찮아요.' 나보단 오빠가 안 괜찮죠. 꿀꺽 말을 삼킨다. 맥주를 석 잔이나 마시고도 다시금 술이 생각나는 밤이다. 터벅터벅. 어둠은 아직 우리 둘의 발걸음 소리만 허락한다. 나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눈을 깜빡깜빡 감았다 땐다. '그거 알아요?' 고래가 말을 시작한다. '예전에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요.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한 유대인이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더라.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날 밤의 어둠이 나를 삼켰는지, 그날 밤의 내가 어땠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오로지 기억나는 것은, 그의 눈빛, 몸짓, 말소리. 행동에서 묻어 나왔다는 나에 대한 감정들. 왈칵 화가 나서 묻고 싶었다.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하지만 내겐 물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개를 숙일 뿐이다. '이 빌어먹을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데요.' 시야가 떨린다. 담 너머로 걸린 나뭇가지도 제 몸을 떨었을 것이다. 꽃잎이 어깨로 떨어졌다 사라진다. 처음부터 떨어지는 꽃잎도 없었을지도 모른다.바보, 정신 차려! 어디선가 누군지 모를 목소리가 꾸짖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뜬다. '별 생각 없이 말한 거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요. ……나도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터져 나오는 긴 한숨을 꿀꺽, 삼킨다. 봄이라기엔 바람은 아직 시리고, 많은 것들이 아직 시리다. 겨울 언저리부터 주고받았던 편지. 고래와 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졌다. 일종의 펜팔이었다. 고래가 글을 올렸다. 자신의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주소를 남겨준다면 편지를 써 드리겠노라고. 나는 그의 휴대폰에 우리 집 주소와 함께 길게 문자를 남겼다. 고래는 그 문자 때문인지 내게 편지 쓸 순간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집이 가까워져 온다. 내 발걸음은 이 순간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고 싶지만, 그는 무엇을 유예하고 싶은 걸까. 고래의 발걸음은 더욱이 느려진다. '저기, 나 최근 들어 살갑게 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래님, 하고 부르다가 요즘에는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판단하기 전에 오빠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나는 횡설수설하다 목이 멘다. 헛기침하고 다시 말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에요. 나는 더는 마음이 커지지 않는데, 오빠는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더 커지기 전에 접게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그가 무언가에 데인 듯 질문한다. 그의 목소리가 관통하던 그 봄날 만우절의 공기를 나는 영원히 못 잊을 것이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것일까? 일순 생각이 스친다.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기에 그만큼 공기가 희박한 것일까. 밤공기가 너무 숨이 막혀 어지럼증이 난다. '그래도요.' 공기가 부족함이 틀림이 없다.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다지도 가슴 뛰는 일인가. 집으로 들어가는 쇠문이 보인다. 나는 재빨리 쇠문을 움켜쥔다. 다행히도 문은 열려있다. 고래는 나를 지나친다. '오빠, 우리 집 여기에요.' 고래는 느린 발걸음을 멈춘다. '아, 더 지나서인 줄 알았어요.' 고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노곤한 밤공기에 동화된듯하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맑은 눈동자가 마음속에 쿡, 하고 박혀 그 외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들어가 봐요. 고래가 말했었다. 뭐라고 또 말했던 것 같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만 가득하다. 내 심장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그의 얼굴을 찬찬히 보다가 문득 그를 안고 싶다는 충동이 인다. 고마웠습니다. 그의 얼굴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고 나는 돌아선다. 모퉁이까지의 거리는 현기증이 일 정도로 멀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뗀다. 처음부터 그에게 가지는 미련은 없었다. 나는 뒤돌지 않음으로 내 마음을 보여준다.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가지 마요. 이른 봄, 밤공기가 내 어깨를 움켜쥔다. 둔탁한 고통은 어깨가 아닌 가슴에서 느껴진다.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 없이 모퉁이를 돈다. 모퉁이를 돌면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으나, 흐르는 눈물 같은 것은 없다. 다시 한 번 하늘을 쳐다본다. 밤하늘은 여전히 물먹은 솜마냥 먹먹하고 흐리다.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얼그레이님의 최근 게시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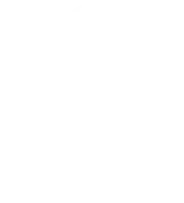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