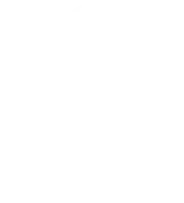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Date | 24/11/07 11:57:09수정됨 |
| Name | 다람쥐 |
| File #1 | KakaoTalk_20241107_110656048_01.jpg (187.6 KB), Download : 88 |
| Subject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 오직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위로 |
|
※줄거리를 직접 따오지는 않으나, 줄거리를 전제로 하거나 작품 속 문장과 관련된 감상이 있습니다. 1. 한강의 소설을 처음 읽은 것은 아마 대학교 2,3학년 시절, "채식주의자"였던 것 같다. 난 원래 문학 비문학을 가리지 않고 글을 읽지만, 채식주의자를 읽고 한국 현대소설은 너무 어렵다고 느껴 한동안 고전만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현대작품은 미술이고 소설이고 너무 어렵다며 출간된지 100년 넘은 작품만 보던 어린 나 ㅋㅋ) 그렇게 한동안 한국 작가의 소설 자체를 읽지 않다가, 두 번째 읽은 한강의 책은 "소년이 온다"였다. 작품의 소재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책 자체를 무겁게 여겼던 것 같고, 당시 변호사가 되겠다며 가열차게 공부를 하고 아이를 키우던 무렵이라 책에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한강의 책을 더 읽지는 않았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책이 나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크게 읽고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2. 그러다가 노벨문학상 소식을 듣고서야,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게 되었다. 책을 받고서도 어떻게 읽혀질까, 노벨상 때문에 책에 선입견을 가지게 될까 싶어 들었다 놨다 하며 쉽게 첫 장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오히려 한강의 다른 작품들의 기억이 희미해서 처음 읽는 책처럼 읽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표지를 넘길 수 있었다. 3. 읽기 시작하자 책을 멈출 수 없어, 만원 지하철에서도 책을 살짝 펴 읽고, 지하철 환승구간을 걸어가면서도 빨리 다음 장을 읽고 싶었던 책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눈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임에도 책이 주는 위로가 너무 따뜻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문학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었다. 어떤 다큐멘터리도, 언론도, 법정의 판결도, 제도도, 심지어 지금 이 세상조차도 위로하지 못하는 아픔을 잘린 손가락이 매끈하게 붙고, 죽은 새에게 다시 모이를 주고, 따뜻한 것을 나눠 마시며 몸 안에 퍼지는 온기를 함께 느끼는 것은 오직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시대를 건너 전해지는 위로이다. 4. 이 소설이 좋았던 지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지점이다. 소설의 시작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린 손가락과 마주한다. 너무나 소중한 내 오른손 검지손가락. 잘려나갔을때 너무 아팠어. 우리도 모두 손가락이 잘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직 없다면 앞으로 있겠지. 그때 잘린 손가락을 포기하고 "포기하자. 이미 잃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잘린 손가락을 붙이며 고통을 느끼고 신경을 계속해서 잇고, 피흘리는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 의사는 오른손 검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환지통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잘린 손가락을 포기해도 넌 평생에 걸쳐 그 잘린 손가락이 아플거야. 이미 잃어버려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손가락이 마치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아플거야. 그렇다면 나는 잘린 손가락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피를 흘리며 고통을 느끼며 그 잘린 손가락을 붙여놓을 것인가. 나의 잘린 손가락은 어디에 뒀더라. 잘렸던 그 순간에 그냥 놔 두고 이젠 잃어버렸다고 억지로 받아들였던 상처가 있다. 아, 작별하지 말 걸. 5. 새는 자유롭고 아름답지만 무게가 너무 가볍다. 그리고 조금만 먹고 마시지 못해도 금방 죽는다. 그것이 생명의 무게이다. 생명이란 그렇게 금방 꺼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는 앵무새 아미가 먼저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왜 죽었어? 몰라, 그냥 죽었어. 우리는 작별에 그럴듯한 설명들을 바란다. "아파서, 다쳐서, 그래서 죽었어." 하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작별이 있다. 이 작별들에 어떤 이유를 붙여도 우리는 그 작별을 납득할 수 없다. "총에 맞아서 죽었어. 왜 총에 맞았는데?", "집에 외삼촌이 없어지니까 대신 외할아버지를 죽였어. 왜 대신 남자어른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래서 아미는 그냥 죽었다. 왜 죽었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아미가 먼저 죽은 것도 말하지 못하는 아마가 살아있었던 것도 매우 상징적이다. 말하는 생명이 먼저 죽고 남겨진 생명은 말할 수 없다. 6. 그럼에도 우리는 작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의 끝을 알고 있다. 아니 정말 끝인가?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에도 서울에 있던 손가락이 잘린 친구가 깨끗하고 흠 없는 손을 가지고 한라산 중산간 눈보라치는 집에 나타나 같이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고 같이 온기를 나누고 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듯이 작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위로는 그치지 않는 눈밭에서도 따뜻하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4-11-20 06:42)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