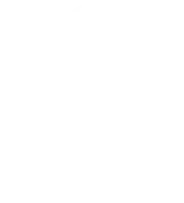어디까지나 눈대중에 지나지 않지만, 습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예 서적을 읽는 층은 일본 전체 인구의 5퍼센트쯤이 아닌가하고 나는 추측합니다. 독자 인구의 핵이라고 할 5퍼센트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염려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뿐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전체 인구의 5퍼센트라고 하면 600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만한 시장이라면 작가로서 어떻든 먹고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문학의 잠재적인 수용자라고 할까, 선거로 말하자면 '부동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창구 같은 게 필요합니다. 혹은 쇼룸 같은 것이. 그리고 그 창구=쇼룸의 하나를 현자 아쿠타가와상이 맡고 있다(지금까지 맡아왔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낼리티는 많은 경우, 허용과 익숙해짐에 의해 당초의 충격력을 상실하는데 그 대신 그런 작품은---만일 내용이 뛰어나고 행운이 따라준다면 그렇다는 얘기지만---'고전'(혹은 '준準고전')으로 격상됩니다.
요컨대 한 사람의 표현자가 됐든 그 작품이 됐든 그것이 오리지널인가 아닌가는 '시간의 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나에게 한 가지 구원이라고 할까, 적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된 것은 내 작품이 많은 문예비평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뭔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가한느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서 자연 발생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걸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나 조화롭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일 당신이 뭔가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원래 어떤 것인가'를, 그런 본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한 권이라도 더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아직 눈이 건강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동안에 이 작업을 똑똑히 해둡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세상은 너무도 조급하게 '백이냐 흑이냐'라는 판단을 내리려고 드는 건 아닐까요. (...) 하지만 그런 절박한 일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 수집에서 결론 제출까지의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모두가 뉴스 해설가나 평론가처럼 의견을 밝힌다면 세상은 빡빡하고 융통성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써야 할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신이 가진 것이 '경량급' 소재고 그 냥이 한정적이라고 해도 조합 방식의 매직만 깨친다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랜 나의 지론인데, 세대 간에 우열 따위는 없습니다. (...) 물론 경향이나 방향성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질량 그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은 굳이 문제로 삼을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혹시 내가 잘못하는건가라는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딱히 불안을 느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데 뭐, 이렇게 쓰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잖아. 그게 뭐가 나빠?' 하고 모른 척 넘어가버렸습니다.
번역이란 기본적으로 테크니컬한 작업이라서 소설을 쓸 때와는 그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의 스트레칭과 같아서 그런 작업을 병행하는 것은 뇌의 균형을 잡는 데 오히려 유익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일을 할 때는 규칙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을 때는 그 기세를 몰아 많이 써버린다, 써지지 않을 때는 쉰다, 라는 것으로는 규칙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 경우, 작품으로서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진 참에 우선 아내에게 원고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작가로서의 거의 첫단계에서부터 일관적으로 계속해온 일입니다. 그녀의 의견은 나에게는 말하자면 음악의 '기준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트집 잡힌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어찌 됐건 고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수긍할 수 없더라고 어쨌든 지적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처음부터 다시 고쳐 씁니다. 지적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의 조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 썼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해도 거기에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퇴고 단계에서는 자존심이나 자부심 따위는 최대한 내던져버리고 달아오른 머리를 적정하게 식히려고 노력합니다. (...) 작품이 출간된 뒤에 들어오는 비평은 마이페이스로 적당히 흘려 넘긴다. 그런 것에 일일이 신경을 쓰다가는 몸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진짜로). 하지만 작품을 쓰는 동안에는 주위에서 들어오는 비평·조언은 가능한 한 허심탄회하게, 겸허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옛날부터의 나의 지론입니다.
장편소설을 다 쓰고 난 작가는 대부분은 흥분 상태로 뇌가 달아올라 반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인 사람은 장편소설 같은 건 일단 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자체에는 딱히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건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에게 제정신인 인간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의해 쟁취해낸 것은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써낸 이야기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소설 따위를 쓰는가. 결국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 힘껏 일했다는 노동의 증거, 그것뿐이다.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작가들 중에는 '마감에 쫓기지 않고서는 소설 같은 건 못 쓴다'고 호언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문인답다'고 할까 스타일로서는 꽤 폼나게 보이지만, 그렇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글을 쓰는 방잇깅 언제까지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재미있고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많아서 타자로 쳐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