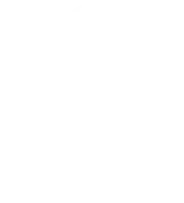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6/05/18 00:27:46 |
| Name | 헤베 |
| Subject | [26주차] 해설피, 나무, 뻐꾸기. |
|
주제 _ 선정자 : 지환 두 명이서 어디론가 가는 이야기 조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합평 방식 분량은 자유고 합평방식은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춤법 검사기 speller.cs.pusan.ac.kr 합평 받고 싶은 부분 하고싶은 말 마감에 쫓기며 급하게 마무리 해요ㅠㅠㅠ 설핏해진 해가 좌편의 대나무 숲으로 기우니, 세상에 먹빛이 스미고 해 아래 모든 것의 그림자가 어스푸름한 어둠에 스러졌다. 메마른 바람은 삼나무숲의 울울한 가지들과 성긴 가시덤불들 사이를 헤매다 소매통으로 불어 들어왔다. 겨드랑이가 도통 시원해지는 게 아닌지라 소나기로 몸을 적시고 방앗잎을 물고 있었나, 착각이 일던 중 그녀가 행낭에서 구겨진 얇은 외투를 꺼내 입더니 발걸음을 빨리 하였다. 앞서 걸어가는 T의 하얀 홍두깨 같은 다리에 시선이 멈추었다. 그녀가 아름답도록 시린 목소리로 말했다. “옷 좀 여며요, 밤공기가 차가워질 거에요.” 그녀의 하얀 치마옷감이 바람에 나풀거렸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시려진 듯 하였다. “괜찮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추워지는 걸요. " 하고는 내가 다가오길 기다리다 괜히 주춤거리자 총총히 걸어와 하얀 손가락으로 셔츠의 윗 단추 몇 개를 능숙하게 뀌어주었다. “됐다니까.” “이렇게 추워지는데, 괜한 고집은요.” 나는 못들은 척 시선을 돌려 우거진 삼나무숲을 바라보았다. 길과 삼나무숲의 경계에 새빨간 양귀비꽃 더미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시선을 돌려버리자, 쳇- 하며 뒤돌아 다시금 걸어갔다. 숲은 점차 어두워져 갔다. 우거진 나무 사이사이로 자연스레 어둠이 스며들었다. 우두커니 서서 어두워지는 숲을 바라보다 어느새 저만큼 멀어가는 T의 뒷모습을 눈으로 밞으며 따라 걸었다. “여기 숲에는 어떤 것들이 살까?” “산노루도 있고요, 슬피 우는 뻐꾸기와 휘파람새도 있어요.” 저 앞에서 그녀가 대답했다. 멀리서도 너무 청명한 목소리에 머릿 속에서 메아리가 울리는 듯 하였다. “이전에 신랑이랑 이 근처로 하얀 민들레 캐러 온 적이 있거든요.” “대답을 바라고 물은 건 아닌데, 그런데 뻐꾸기가 슬피 울던가?“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내가 그녀의 뒤쪽을 사선을 그리며 걸어가 반쪽 얼굴을 바라보니 조그마한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그랬어요. 슬피 울었어요. 뻐꾹뻐꾹 하고요.” “그냥 울 때랑 슬퍼 울 때랑 다른가. 이해하기 어렵군.” “달라요. 달라요. 당신 같이 속 편한 사람은 모르시겠죠.” "왜지?" “왜라니요? 그냥 울 때는 뻐국, 슬퍼 울 때는 뻐국. 사람 우는 마음도 모르면서 괜한 뻐꾸기는 구경도 마세요.” 나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녀가 매만진 셔츠 언저리에 검지와 엄지를 차례로 대보았다. 하얀 손가락이 만져질 것을 기대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무엇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인지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히자 그녀가 아득해졌다. 실제로 그녀는 멀어지고 있었고, “사납게 구는 걸. 곧 떠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큰 목소리로 말했으니 분명 그녀는 들었으리라, 생각했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연건, 언젠가 풀벌레 우는 숲 속에서 뻐꾸기 소리가 뻐꾹-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셋째로 들려오려던 즈음이었다. 멀리 돌산의 저 위에 허연 달이 생겨났다.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찾아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앞으로 볼 일 없어요.” 그녀가 빙글 뒤돌아 섰다. 항상 그녀가 울먹이려 할 땐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느새 뺨엔 흘린 눈물로 숱진 머릿칼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내 뺨엔 까슬까슬한 소름이 돋히는 걸 느꼈다. “괜한 농담을,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나는 짓궂게 돌을 던지 듯 툭- 말했다. 마치 우는 그녀를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말투였으니 나도 말하고는 놀라버렸다. 그녀가 컴컴하게 짙은 그늘 같은 표정으로 굳어진 채 나를 응시하였다. 숲 속의 어둠보다 더 검은 그늘이니, 추위가 찾아왔다. 눈길을 피할 수 없어 가만히 쳐다보려니, 목구멍이 숨뭉치로 틀어 막힌 듯 답답해졌다. 그녀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음 섞인 숨소리로 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언제 가실 거에요? 다른 사람한테 방을 내줄 거에요.” “오늘 밤만 보내고 내일 정오쯤에.” “다른 손님 방으로 가 떠들며 놀다가 자버릴 거에요. 술도 마시고 새벽엔 홀로 남아 머리 빗다가 잠들어 버릴 거에요.” 그녀는 하얀 치마폭을 여러 가래로 추려서 하얀 손가락으로 틀어 잡더니 조금 들어 올렸다. 무릎을 드러내고, “진짜 그렇게 할 거란 게 더 슬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치마를 붙잡은 채 언덕 아래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가만히 지켜보다 그녀가 서있었던 자리로 가 남은 채취를 느끼려 하였지만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헤어질 때 아련해지는 건 견디기가 힘들어. 차라리 미워하며 우는 편이 나아.”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