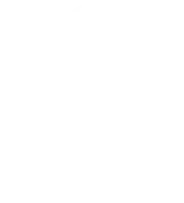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6/05/24 01:50:13 |
| Name | 헤베 |
| Subject | [조각글 27주차] 곱등이 |
|
암울한 곱등이의 표상이자 위대한 인고충 C의 행방이 묘연해진지 닷새나 지났다. 다수의 곱등이들은 평소 그가 보인 사회성으로 짐작하메 '제 발로 이 곳을 탈출한 것이 아니냐,' 추측하였으나 곱등이 A는 심한 억측이자 비약이라고 일축하였다. 언젠가 그는 함부로 입을 터는 곱등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C는 이 곳의 부식질을 최고라 여기며 계속 머물고자 하였다. 네 놈들이 무얼 알기는 알아!' 또는, '당신들이 그가 가진 두 쌍의 더듬이를 비난해도 그는 꾹꾹 참아내는 위대한 곱등이였다.' 라고 역설했지만 비열한 곱등이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갈색 더듬이를 추하게 깔딱거리며 비웃기를, '지깟 놈이 무어가 잘났다고!' '한 쌍이어야 옳은 더듬이가 또 있는 흉물 주제에!' '변종이야 떠나든 말든! 머저리같은 놈' 이라고 지껄이기 일쑤였기에 A는 이를 데 없는 환멸과 답답함을 감내해야 했다. 한 편으론 또 몽매한 저것들의 의견이 모조리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렇다! 궃은 모략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 어디 깨진 타일 속 축축한 흙더미에 코를 박고 부식질을 추려 먹고 있을 위대한 C를 찾아야만 했다. 하여 A는 계획을 세운 이듬 날 아들 넷과 처를 동원해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시점인 지금, 짧다면 짧고 생각하자면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곱등이들의 밤을 밝히던 형광등의 불빛이 사라지고 몇 시간 후 시침이 자정에 다다르자 파란 파레트 밑 먼지더미 속에서 성체 곱등이 여럿이 어기적거리며 기어나왔다. 앞장 서 걷던 곱등이 A가 걸음을 멈추자 뒤따라 걷던 다섯의 곱등이도 멀뚱히 섰다 그 중에 하나가 다리 갈퀴에 묻은 먼지부수러기를 입으로 털어내며 A에게 칭얼거렸다. "아부지, 사흘 째요. 이제 그만할 때도 안됐소?" 그러자 나머지 셋의 더듬이가 까닥거렸다. 한 녀석이 말을 보탰다. 검은 눈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맞아요. 이렇게 끼니까지 걸러가며 찾아다녀야만 하는 아저저씬가요? 아버지도 지치셨잖아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어머니 B는 곱등이 A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굽어있는 등이 측은하였다. "오늘까지만 찾아보자. 분명 어딘 가에 있을 거다. 쉽게 돌아갈 녀석이 아니다." 어머니 B는 A의 어투 속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는 그 자신도 슬퍼지는 듯 하였다. 그녀가 펄쩍 뛰더니 A 곁으로 안착했다. 뒷 다리 관절이 아리는 듯 황갈색 이마를 찌푸렸다. "오늘까지 라시잖니. 맏이는 애들 데리고 저 쪽으로 가려므나. 얘야, 검은 거미와 입이 뾰족한 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잘 알고 있지?" 곱등이 하나가 더듬이를 사납게 흔들며, " 하루 이틀 산 곱등인 줄 아시나봐요." " 아침이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있으렴." 맏이는 틱틱거리며 어린 곱등이들을 데리고 어둠 속 책더미들 사이로 사라졌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B가 뒷다리를 접었다 피며 말했다 " 우리도 가요. 저 녀석들 자기 몫은 할 거에요." A가 한참 만에 대답했다. " ......오늘은 저 밑을 기어봅시다" 그들은 지면에서 위로 조금 떨어진 선반대 좁은 틈 사이를 힘겹게 비집고 들어갔다. 어느세 시침이 아침을 알리고, 지상의 햇빛이 지하 창고로 새어 들어왔다. 거대한 선반대 밑을 뒤지던 곱등이 A와 B는 먼지를 뒤집어 쓴채 녹초가 되어 기어나왔다. " 애들 아빠, 오늘은 이만 하는 게 어때요...... 곧 사람들이 올 거에요." A의 먼지 묻은 더듬이가 땅에 닿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허한 눈길로 지상으로부터 새어 들어오는 햇빛을 응시했다. "이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C씨는 잘 살고 있을 거에요.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B는 터덜터덜 걸어가는 A의 안쓰러운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확신했기에 A의 허탈함이 더 깊어졌다. 반드시 C라면 그 어디에선가 남들과 다른 두 쌍의 더듬이로 열과 성을 다해 먹이를 찾고, 뉠 자리를 찾아가며 외롭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오늘처럼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며 단잠에 들 것임을. 다만......A의 눈에 그가 띄지 않음에 확신에서 기대로 변해갔지만 여전히 A는 C에게 마음이 향했다. '외로웠을 녀석...... 그래야지.' A를 저 멀리 앞서가던 B가 파란 파레트 밑에 도착하여 그들의 집이 아직도 텅 비어 있는 걸 알아차린 건 7시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아침이 밝기 전 돌아와 있어야 할 맏이와 어린 자식들이 8시가 되어가도 보이질 않자 어머니 B는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곱등이 A와 B는 파란 파레트 밑으로 고개만 간신히 내어놓고 자식들이 사라졌던 쪽을 주시하였다. "이 얘들이 왜 이리도 안 오는 걸까요." "기다려봅시다. 곧 맏이가 얘들 데리고 나타날 거요." 흐르는 분침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B의속삭이는 소리가 격해졌다. 또깍거리는 분침소리가 B의 마음 속을 꿰뚫어 놓으니 8시 30분을 넘어가고나서는 그녀의 동작들이 눈에 띄게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거의 흐느끼 듯 절절해지는 B의 목소리에 A 또한 낙담해지려는 그 찰나에, 창고 문이 열리며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그와 동시에 선반대의 두번 째 선반에서 아이들이 나타났다. "오 세상에, 감사합니다." B가 눈물을 머금은 채 뛰쳐나가려는 걸 A가 급하게 제지하였다. 아이들도 미처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 지 곧바로 뛰어 내리려 하였고 B와 A는 더듬이를 세차게 흔들며 아이들에게 위협을 알렸다. "저 인간 눈에 밞히면 독한 액체에 절여져 죽어버려. 숨어야 해."A가 B를 깊숙한 곳으로 끄집어 당기며 인간에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숨어들어 인간의 동태를 살폈다. 자식들도 맏이를 필두로 그늘 속으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인간은 파래트 바로 앞에 놓여 있던 20부 짜리 무거운 책다발을 들고 돌아가려 하였다. A와 B는 여전히 낮은 곳에서 게처럼 눈만 내놓고 인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때 B가 소리쳤다. "어머! 저 인간이 들고 가는 저 책다발 밑에 좀 봐요" 이미 그의 시선이 먼저 닿아 있었다. 곱등이 A는 검은 눈을 끔뻑이며 책다발 밑에 납작하게 압사되어 지하세계 저 바깥으로 실려가는 절반뿐인 머리 쪽 사체를 올려 보았다. 곱등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긴 더듬이 한 쌍이 붙어 있었다. 나머지 반 쪽은 책다발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곤죽이 되어 짓이겨져 있었다. 더듬이 한 쌍이 오래된 흑갈색 체액과 함께 말라 붙어있었다. "나 참, 죽었구나 저 녀석......" A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현기증이 이는 듯 어지러웠다. 급기야 실려나가는 C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오는 듯 하였다. ' 자 난 갑니다! 저 빌어먹을 놈들이야 이 구덩이에 내버려 두고 난 떠납니다! ' 그는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차라리 A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A의 더듬이가 눈에 띄게 떨렸다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