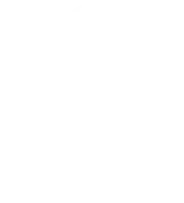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7/11/02 18:25:28 |
| Name | droysen |
| Subject | 독일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4편 |
|
안녕하세요. 방금 열심히 이번 편을 쓰다가 실수로 전체 내용을 날리게 되서,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되었네요 -.- 글이 날라가는게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군요... 거의 다 썼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힘을 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2월 초에 학기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페이퍼를 쓸 준비를 해야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학과 다른 부분이었는데, 학기가 끝날 때에 맞춰 페이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페이퍼를 내야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방학이 없는 것 같아서 역시 독일 대학은 잔인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여러모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세미나에 참여해서 토의하고 텍스트도 열심히 읽은 후에, 이것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지고 글을 쓰게되다 보니 아무래도 생각과 글의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다음 학기가 개강하기 전까지 페이퍼를 내야했지만, 독일 학생들의 경우 교수와 협의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더군요. 사실 저도 이런 유혹에 안 빠진 것은 아닌데, 이런 면에서라도 성실함을 보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 또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정작 다음 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전 학기 페이퍼를 쓴다는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초기근대의 신성로마제국" 세미나의 페이퍼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과목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부터 독일 대학의 엄격함에 대해서 들어서, "이거 낙제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쪽팔려서 어쩌나" 싶은 마음에 학기 내내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게다가 초기 근대는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거든요. 이 세미나의 선생님은 학부 과목임에도 페이퍼 주제를 따로 정해주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쓰기 시작하기 이전에 본인의 면담 시간에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허락을 받을 것, 그리고 이후에 메일로 미리 짜놓은 목차와 참고문헌 등을 보낼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 분야에 정통하지 않다보니, 전통적인 주제보다는 약간은 변칙적인 (?)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다녀온 후 쓴 기행문을 분석해서, 당시 신성로마제국 사람들이 정작 본국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유추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1차원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당시 신성로마제국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여행을 갔다 온 후 대체로 아메리카 대륙의 풍족한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묘사하는데요. 이는 역으로 신성로마제국이 당시 극도의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바닥난 상황이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방식의 설명입니다. 이런 방식을 나름대로 조금 더 고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니까 나름대로 깊게 생각해본 것 같다면서 열심히 써보라고 하더군요. 3주 정도 열심히 썼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료의 서체였습니다. 당시 독일의 인쇄된 서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Fraktur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문장과 글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해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고로 독일은 2차세계대전까지 이 글씨체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1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과 러시아제국" 세미나의 페이퍼를 썼습니다. 이 경우는 학기 중부터 미리 주제를 짜놓고 준비를 좀 해서 나름대로 수월했습니다. 피셔테제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학자 프리츠 피셔(Fritz Fischer)가 주장한 테제와 그를 둘러싼 논쟁사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 피셔라는 사람은 독일이 치밀한 계획하에 목표를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부러 발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이런 주장은 독일 역사학계 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고, 이 논쟁 자체가 1960년대부터 독일 역사학계가 다루는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의 발전사를 다뤄보고자 했던 것이었죠. 첫번째 주제보다는 사건과 주장의 요약, 정리에 치우친 페이퍼라, 성실하게 작업하면 나름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연구의 여러 문제들" 세미나의 페이퍼를 써야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발표한 주제를 그대로 발전시켜서 페이퍼를 쓰기로 교수와 논의했기 때문에 준비가 이미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동유럽 연구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 동독, 그리고 현재 독일 역사학계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관해 쓰는 것이었죠.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동유럽 연구가 나치 하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독일 역사학계가 나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읽었을때 생각되는 것보다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 하지만 우선은 패스하겠습니다. "지구사" 세미나의 경우는 지구사 라는 방법론 자체가 최신의 역사학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론에 나름대로의 비판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건 순수한 역사학적 방법론의 문제라, 역시 패스하겠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매일 학교 도서관으로 출근해서 글을 쓰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면서 다시 내일 쓸꺼를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4월이 되어서 다 쓰고 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애초에 계획을 잘못 짰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아무래도 한 학기에 4개의 세미나를 듣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ㅡㅡ 어쨌든 다음 학기 개강 직전에 글을 마무리해서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뮌헨, 잘츠부르크, 할슈타트에 다녀왔는데요. 나중에 여유되시는 분들은 할슈타트 꼭 갔다와보세요. 정말 예뻐요. 예쁘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할슈타트에서 찍은 사진 중에 예쁜게 있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걸 올리려다가 글이 날라가는 바람에 -.- 다시 시도하지는 않겠습니다 ㅋㅋ 근데 여행 말미에 할슈타트에 있는데, 메일로 과목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알림이 오더군요. 독일 대학은 한국과는 달리 평가 마감 기한이라는게 없습니다. 한국은 몇일 몇시까지 선생님들이 평가를 마쳐야해서, 그 시간이 되면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을 하잖아요? 독일은 그런게 안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의 교수가 한 페이퍼에 대한 채점을 마치고 그걸 입력하면, 그때그때 해당학생에게 확인하라고 알림이 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독일 대학을 겪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면이 등장하는데, 평가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방금 말한 과목은 은퇴하기 직전의 부지런한 노교수님이 진행하셔서 바로 평가가 이뤄졌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낸 페이퍼가 다음 학기 수업기간이 끝나고 나옵니다. 4월 초에 낸 페이퍼가 8월이나 9월에 평가되는 것이죠. 이것도 평균이고, 제가 경험한 가장 오래걸린 평가는 1년이었습니다... 4월에 낸 페이퍼를 다음 해 4월에 평가해주더군요. 그것도 석사논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니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정작 독일 학생들도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라,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만 불편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독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상관하지 않더군요. 어쨌든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확인합니다. 2,3이 뜹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독일에서는 1,0이 가장 좋은 점수가 4,0이하가 낙제입니다. 2,3이라면 한국으로 치면 b- 정도 될까요. 독일에 처음 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썼는데... 한국에선 어디서도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점수밖에 못 받나? 싶고 말이죠. 참고로 독일은 당연히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물론 독일의 점수가 보통 한국 점수보다는 쉽게 말해서 짠데, 그래도 기분이 영 좋지 못하더군요. 내가 외국인이라 말하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수업 중에는 활약(?)을 잘 못해도 글로 쓰는 것은 독일애들 못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말었어요. 여행지에서 서러움에 눈물이 나고야 맙니다. 숙소 테라스에서 눈물 때문에 흐릿해진 할슈타트 호수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행지에서 바로 교수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평가해준 것을 확인했다. 내가 독일어로 처음 글을 써봐서 그러는데, 혹시 뭐를 잘못했고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 면담시간에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찾아갔는데... 이건 뭐지? 싶습니다. 독일어 표현들을 몇개 고친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글 끝 부분에 평가를 써놓은 것에도 Alles in Ordnung ("다 잘되었다" 정도?) 라고 써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분은 그냥 점수가 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가장 먼저 쓴 초기근대의 신성로마제국 과목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이건 제가 먼저 평가를 빨리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았기에 혹시 평가를 빨리 해줄수 있냐고 부탁드린 것이죠. 개강하고 첫주까지 본인이 읽어보겠다고 하셔서 역시 그때 찾아갔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대뜸 "내 수업이 자네한테 지루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나?"라고 묻습니다. 그럴리가요 라고 대답하고 어땠냐고 여줘보니 아주 잘 썼다고 말해줍니다. 독일어 관련해서만 몇개 고칠 부분을 제출한 페이퍼 여백에 써주셨고, 필요하면 복사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입학 담당자가 누구냐고, 지금부터는 본인이 처리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주십니다. 연구실을 나오고 건물 밖을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번째 네번째 평가는 각각 8월과 다음 해 4월 (-.-)에 이뤄졌기 때문에 잠시 미루고, 어느새 다음 학기 개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여름 학기에 듣게 되는 수업은 포어레숭으로는 각각 Die Weimarer Republik (바이마르 공화국), Kolonialgeschichte 1850-1920 (식민지사 1850-1920), 그리고 Wirtschaftsgeschichte der USA (미국 경제사)였습니다. 세미나는 Europa und die Dekolonialisierung (유럽과 탈식민지화), Kulturkontakt, Kulturkonflikt, Kulturtransfer (문화접촉, 문화충돌, 문화전이) 였습니다. 겨울 독일의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따사로운 햇살아래 새로운 여름학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droysen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