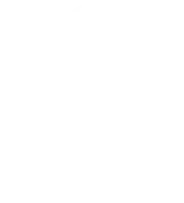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7/01/09 21:20:26 |
| Name | SCV |
| Subject | '항해' - 병영문학상 입선작 |
|
항해 역풍 불어올 때면. 뾰족한 삼각 돛 펼쳐 바람맞이하고 굵은 돛대로 거센 바람 끌어안아 배를 일으킨다. 높은 곳에 서서 먼 앞을 내다보곤 할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다급한 암초 외침 소리에 키잡이는 손바닥이 벗겨지지만 또 다시 배는 일어선다. 어느새 푸른 물결은 사라지고 선원들의 얼굴 닮은 까만 물결 퍼져올 때면 그들의 머리위엔 작은 길잡이들과 환하게 웃는 하늘의 등불이 밤이슬에 젖은 선원의 머리칼을 어루만진다. 상어의 힘줄 보다 더 굵은 팔뚝과 밧줄을 닮아가는 손을 가진 그들은 꿈속에서 어느 해변의 주점에서 마주한 여인과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며 밤새 바다의 냄새에 절여진다. 지칠 줄 모르는 다랑어 같이. 외로운 한 마리 일각고래 같이 배는. 차가운 어둠과, 검은 파도와, 흰 바람과 마주하며 바다 한 가운데 등대처럼 솟는다. 이윽고 바다의 취기에서 깨어나 딱딱한 땅에 입맞춤 할 때가 가까이 오면 아껴두었던 술과 고기들을 꺼내어 돌고래들과 파티를 연다. 다다른 곳에서는 무거운 닻이 배를 지키고 벗겨진 손을 어루만져 줄 사람을, 별과 달과 바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술을 함께 나누며 취할 사람을 찾아 어딘가. 어딘가로 잠시 바다를 잊으러 간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바다에 너무 오래 취해버린 선원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시 배로 모여든다. "닻을 올려라!" "으쌰!" "돛을 펼쳐라!" "으쌰!" 돛이 부풀어 오르며 먼지를 털어내면 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끄러지며 또 다른 바다에 몸을 싣는다. --------- 한때는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어 했던 문학소년(??? 어딜봐서...) 이었으나, 지금은 공돌이(?)와 법조계(?)를 거쳐 기획자 겸 PMO로 일하고 있네요. 소싯적에 글 좀 쓴다고 깝죽거렸는데... 제일 큰 상(?) 이자 문집에 글이 실린게 저 '항해' 라는 시 입니다. 사실 역풍-삼각돛만 보면 게임좀 하셨다는 분들은 눈치채셨을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항해시대 -_- 이야기에요. 고딩때 넷츠고 환타지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올렸었기도 했는데... 지금은 굽시니스트가 된 '사문난적'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 나노단위로 비평 당하기도 했고.. 생각해보니 그때 제 느낌이 지금 헤칼트님이랑 비슷했던거 같기도 합니다 ㅋㅋ 뭐 아무튼. 저건 처음에 인하대 백일장 가서 쓴 글이었는데 정작 거기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군 입대하고 나서 친하게 지내던 대대 교육장교 형님이 뭐 좀 써둔거 없냐 그래서 예전에 썼던거 싹 다 꺼내서 보냈는데, 저게 당선이 되어서 국방부장관에게 시계도 받고 그랬네요 ㅎㅎㅎ 또 군대에서 글을 좀 써둔게 있긴 하지만 그건 다음에. 나이먹고 틀에 박힌 일만 하다 보니 글이 참 안써지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 스물 넷 다섯때 써둔 글을 보면 참 서늘하고 좋던데. 최근에 추게에 간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 라는 글도, 사실은 스물 다섯,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쯤에 쓴 글이에요 ㅎㅎㅎ 지금의 저보다 옛날의 제가 글쓰는건 한참 더 나은거 같습니다. 인간이 퇴화하면 안되는데 쩝... ㅠ 지금은 저런 시도 글도 나오기가 힘드니 참 ㅎㅎㅎ 근데 내가 이 글을 왜 퍼왔더라... 아,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듣다가 생각나서 옮겨왔어요. 그 노래와 이 시는 '게임'이 모티브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ㅎㅎ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CV님의 최근 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