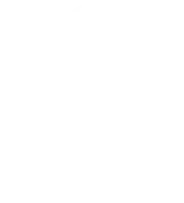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7/03/10 23:22:49 |
| Name | 선비 |
| Subject | 피스 카페 (1) |
|
2편은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담배와 낯선 향신료가 섞인 냄새가 나는 다문화 거리를 지나쳐 원곡동에 있는 내 복도식 아파트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 진창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는 골목을 지나쳐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죽은 쥐가 내는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났다. 며칠 전부터 하는 마른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늦췄다. 집에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건조대 위의 빨래를 보느니 바에서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나을 듯싶었다. 어두운 골목을 다시 돌아 나오니 평소엔 눈여겨서 보지 않았을 피스 카페(Мир Кафе)라는 이름의 러시안 바가 보였다. 이 도시에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불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있는 두꺼운 유리문을 열자 촌스러운 분홍색상의 문발이 있었다. 그것들을 헤쳐 나오자 매캐한 담배 연기 사이로 커다란 덩치의 바텐더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는 바에 가 앉았다. “담배 피워도 됩니까?” 내가 말했다. “경찰이쇼?” 바텐더가 다소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했다. 검은 머리지만 동양인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커다란 덩치에, 국적을 알기 힘든 권태로운 표정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또다시 기침이 나왔다. 바텐더가 한 손으로 커다란 초록색 재떨이를 내밀었다. 정말이지 솥뚜껑같이 큰 손이었다. 나는 싸구려 버번 위스키를 한 잔 시키고 담배를 천천히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금발의 러시아 여자 두 명이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의 다른 쪽 끝에는 역시 러시아 사람으로 보이는 노인 한 명이 혼자 보드카와 절인 오이를 먹고 있었다. 가게 중앙의 싸구려 홍등가에서나 보일 법한 주황색의 조명등 밑에는 당구대가 가게 면적의 1/4을 홀로 차지하며 외로이 놓여있었다. 막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다. 가게 입구의 문발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동양인 여자였다. 묶어서 올린 짙은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게엔 어울리지 않은 지나치게 단정한 흰색 스웨터와 검정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숙련된 보석 감정사가 그러듯 눈을 가늘게 뜨고 바를 훑어보고는, 바텐더에게 다가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 옆의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이 바의 손님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녀는 다소 빠른 손놀림으로 핸드백 안을 뒤지고 있었다. “불 빌려드릴까요?” 내가 말했다. “네, 부탁합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입술 위에는 보일 듯 말 듯 한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성냥불을 건네 주었다. 그녀가 몇 차례 성냥불을 꺼뜨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사서마냥 단정하게 정리된 손끝을 바라보았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나는 성냥불을 켜고는 그녀의 담배 끝에 가져다 댔다. 담배에 불이 붙고 그녀는 두어 차례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그보다?” 나는 또다시 마른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러시아어를 잘하시네요?” “그야 러시아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살짝 소리 내 웃었다. “이리나라고 해요.” “원입니다.” 때 맞춰 그녀가 주문한 맥주가 나왔다. 이리나는 하바롭스크라는 러시아 동단의 한 도시에서 왔다고 했다. 부모님은 모두 고려인이라고 했다. 한국어는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여행 온 것이라는 말도 들려주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아주 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발음이 아주 정확한데요.” “네?” “발.음.이. 아.주. 정.확.하.다.고.요.” 나도 그녀를 따라 또박또박 말했다. 뭐가 우스운지 그녀가 한 차례 또 웃었다. 나는 남은 버번을 털어 넘겼다. 몸이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독하네요.” 마른기침이 한차례 또 나왔다. “맥주라도 드실래요?” 이리나가 남은 맥주를 건네면서 물었다. “괜찮습니다. 러시아 술을 마셔야겠어요.” 나는 보드카를 두 잔 더 시켰다.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