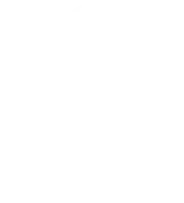-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7/12/06 11:27:35 |
| Name | 구밀복검 |
| Subject | 둥글둥글 왕감자 |
|
200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타 뮐러의 대표작으로 <숨그네>란 게 있습니다. 2차대전 도중 루마니아 거주하던 독일계 동성애자 청년이 루마니아로 진주해온 소련 군대에 끌려가서 시베리아 수용소 생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동에서 잘 팔아먹었죠. 이게 과거 같으면 '않이 억떡계 2차대전 이야기를 하면서 나치놈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냥'이라고 까였을 텐데 시절이 많이 좋아진 셈...그 전 해에 비슷하게 2차대전을 독일인 커플의 시선에서 바라본 <더 리더>가 오스카 여우주연상 가져간 것도 아다리가 맞고요. 사실 독일계 동성애자 루마니아인이 소련 수용소 끌려간 이야기 자체는 특수 상황입니다만, 한국 군대란 게 수용소와 원체 비슷하다보니 병역 복무를 끝낸 갓치남이라면 쉽게 일반적인 시선에서 공감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군대에서 읽었는데 주인공 놈하고 저 중에 누가 더 불쌍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뭐 굳이 군대 아니더라도 고리짝 초중고등학교도 군대나 수용소 비스무리하니 굳이 군복무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추체험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여튼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 느끼는 주인공의 심사를 보다 정치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사 자체를 운문에 가깝게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창조적인 조어造語가 많아서 읽는 맛이 좋습니다. 가령 제목인 <숨그네>라는 어휘 자체가 수용소에서 행하는 삽질을 의미하죠. 삽질을 하다보면 삽을 한 번 뜰 때마다 그에 맞춰 가쁘게 숨을 쉬게 되잖아요? 마침 삽의 대가리 자체도 심장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삽을 뜨고 내고 하면서 삽이 그네처럼 왔다갔다 하는 동안 심장도 팔딱팔딱 뛰면서 숨을 쉬니까 삽질을 하는 것은 숨그네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외에도 재미있는 어휘들이 많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한방울넘치는행복'이라는 조어로 지칭한다든가, 수용소에서 학대받는 것을 '뼈와가죽의시간'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다음은 작중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감자인간]이란 대목의 일부이에요. 주인공이 담당하는 수용소 내의 노역 중 하나가 감자를 캐오는 것이죠. - 나는 크고 작은 감자를 모자 속까지 온 몸에 채워넣었다. 나는 273개까지 셌다. '배고픈 천사'는 상습 절도범이었는데도 나를 도왔다. 그러나 나를 도운 후에는 역시 상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답게 돌아오는 먼 길을 나홀로 버려두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고향에서 보낸 마지막 여름, 어머니는 식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 감자는 포크로 찍지 마라. 갈라지니까. 포크는 고기에 쓰는 거지.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스텝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고, 어느 밤 스텝에서 감자가 나를 땅 밑으로 끌어내리고, 별이 공중에서 날카롭게 찌를 줄은. 들판과 풀밭을 지나 내가 찬장인 양 나를 밀며 수용소 정문으로 갈 날이 있을 줄은 그 당시 식탁에 앉았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불과 삼 년 만에, 한밤중에 홀로 [감자인간]이 되어 수용소로 돌아가는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르게 될 줄은. 다음날 알베르트 기온에게 주려고 중간 크기 감자 세 알을 지하실로 가져갔다. 철망에 올려놓고 지하실 뒤편의 불에 조용히 구워먹으려니 생각했는데 그는 받지 않는다. 그는 감자 한 알 한 알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왜 하필 273개냐. 영하 273도는 절대 영도니까요. 내가 말한다.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오늘은 웬 과학 타령이냐. 그가 말한다. 잘못 센 건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말한다. 273이라는 숫자는 스스로 삼가거든요. 절대 영도는 가설이잖아요. - 하나 더 꼽자면 [대리형제]라는 에피소드네요. 수용소 생활 도중에 주인공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뻘은 되는 동생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인공이 살아 돌아올 공산이 적어보이니까 대 이을 애 하나 더 낳은 거죠. - 11월 초 투어 프리쿨리치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집에서 편지가 왔다고 했다. 카드에 사진 한 장이 붙었다. 사진은 하얀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다. 재봉틀 땀이 정확하다. 사진 속에 아이가 있다. 투어는 내 얼굴을, 나는 엽서를, 박음질한 사진 속의 아이는 내 얼굴을 본다. 캐비닛 문에 붙은 스탈린은 우리 모두의 얼굴을 쳐다본다. 사진 아래 이렇게 쓰여 있다. 로베르트, 1947년 4월 17일 출생. 어머니의 손글씨다. 사진 속 아이는 뜨개질로 뜬 모자를 썼다. 모자는 턱 밑에 리본으로 묶여 있다. 나는 다시 읽는다. 로베르트, 1947년 4월 17일 출생. 그것 뿐이었다. 손글씨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태어났다는 말 대신 '출생'이라는 단어 하나로 자리를 아끼려는 어머니의 실용적인 사고 방식. 맥박이 내 손이 아니라 들고 있는 엽서에서 뛴다. 차 마시겠나. 투어가 묻는다. 화주 마시겠나. 기뻐할 줄 알았더니. 예. 내가 말한다. 기뻐요. 집에 아직 옛날 재봉틀이 있어서. 눈이 수용소 담과 함께 차츰 멀어진다. 그런데도 내가 걷고 있는 수용소 부지에는 눈이 목까지 차오른다. 바람에는 날카로운 낫이 달렸다. 나는 발이 없다. 뺨으로 걷다가 곧 뺨도 사라진다. 내가 가진 것은 박음질한 아이뿐이다. 그는 나의 [대리형제]다. 내 생사를 모르는 부모님이 아이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태어났다는 말을 '출생'이라고 줄여썼듯, 죽었다는 말도 '사망'이라고 쓸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그렇게 했다. 어머니는 하얀 박음질땀이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그 한 줄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안다면. 너는 거기서 죽어도 돼, 그게 내 입장이야. 집에 입 하나 준 셈 치고. - 끝으로...감자와 절대 영도하면 이걸 또 빼놓으면 섭하겠죠.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구밀복검님의 최근 게시물
|
|